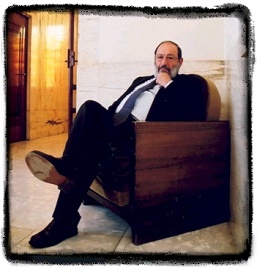|
움베르토 에코의 기호학 이론 비판 / 박상진
2006/11/06 12:04 |
다음 글은 한국기호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박상진 부산외대 교수의 소논문 <문화비평, 기호학, 소설 - 움베르토 에코가 걸어온 길>을 옮긴 것입니다. 국내에 몇 안되는 움베르토 에코 비판자인 박상진교수는 이 논문에서 에코의 '열림'의 기호학이 현실과의 긴밀한 관련성보다는 이론 내적인 구축에만 열중해 왔고, 이후 몇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의 거리는 극복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퇴화되고 있다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에코의 기호학 이론이 지닌 이런 맹점은 간과하고, 그 이론이 지닌 가능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마저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코의 '열린 예술작품', '모델독자-모델작가' 이론이 문학과 예술 일반에서의 해석의 다양성을 확장시키고 주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면에서 놀라운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만, 이러한 반대 입장의 주장 역시도 나름대로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맥락에서 주장을 펼치는 김운찬 교수의 글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더욱 흥미롭겠습니다.
----------------------------------------------------------------------------------------
<문화비평, 기호학, 소설 - 움베르토 에코가 걸어온 길>
1. 이론과 실천
작년에 나온 마이클 시저의 책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기호학자이면서, 소설가, 또 문화비평가인 움베르토 에코가 이제까지 쌓아온 지적 성과들을 이론과 창작의 두 측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론과 창작, 또는 이론과 실천이라는 문제는 에코를 평가하는데 있어 적절한 출발점이 된다. 시저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인 끝에 완성한 이 책에서 두드러진 점은 에코를 "연속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에코의 이론 자체, 그리고 이론과 창작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가능한 관점에서 보면, "에코"라는 한계를 도그마틱하게 추종하는 것일 수 있다.
에코가 최초의 저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적 문제Il problema estetico in Tommaso d'Aquino]를 쓴 지 40 년이 넘었다. 누구든 40 여 년의 세월동안 하나의 입장과 노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저는 에코가 초기의 입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보며 논의를 전개한다. 한편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시간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장르와 범주를 넘나드는 것에도 적용된다. 시저가 자신의 책에 붙인 제목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기호학과 소설, 그리고 실제 문화 비평은 에코의 글쓰기의 주요한 세 범주들이다. 시저는, 기호학이 이론이라면, 나머지 둘은 실천이라는 구도 위에서, 이 세 범주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고 기술한다. 만일 이런 식의 "연속성"이 성공적으로 주장될 수 있다면 - 더욱 탄탄하고 치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 이는 에코의 후광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만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여기서 떠오르는 문제는 에코가 이론과 실천을 종합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원론적으로 말해 이론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론과 실천의 작업을 모두 한다고 해서 곧 자동적으로 그 둘이 종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이론이 실천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고 정당화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에코의 경우, 문화 비평과 소설 창작의 영역에서 지향하는 바가 그의 기호학에서는 그리 깔끔하게 이론화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괴리는 어떻게, 왜 생겨났을까?
시저는 이러한 질문에 시원스럽게 답해주지 않는다. 물론 애초에 그런 질문을 가져보지 않았고, 또, 그런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비판적인 관점에서 에코의 기호학 이론이 성립되고 발전되어온 과정과 내용을 추적하고 그의 대중 문화 비평과 소설을 읽어보면, 그의 이론과 실천에는 선명하지 않아도 부정할 수는 없는 어떤 단절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시저는 에코의 전체 지적 활동을 시기적으로는 전기호학(pre-semiotic), 기호학, 텍스트 기호학의 시기로 나누고, 내용상으로는 문화비평과 기호학 (또는 이론 작업), 소설로 구분한다. 이 두 범주는 서로 교차한다. 즉 전기호학 시기에서는 문화 비평과 이론 작업이, 기호학 시기에서는 문화 비평과 기호학이, 텍스트 기호학 시기에서는 문화 비평과 기호학과 소설이 모두 나타난다. 에코의 이런 전체 지적 활동에서 특이한 것은, 그 실제 활동의 범위는 비평과 기호학, 소설로 계속 넓혀져 온 반면, 그의 이론 작업의 내용적 범위는 계속 축소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전기호학 시기에서 그의 이론적 관심은, 구조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실천적, 윤리적인 지식인의 자세를 체계화하는 것이었던 한편, 기호학 시기인 70년대에는 이러한 관심이 기호학이라는 보편 학문을 수립하는데 집중되었고, 80년대 이후에는, 아마도 소설 창작과 함께, 텍스트 기호학 내지 텍스트 이론이라는 더욱 협소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여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출판한 [칸트와 오리너구리Kant e l'ornitorinco]나 [뜻 밖의 발견Serendipity] 같은 작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기호학 시기의 작업에서 보여주었던 현실과의 팽팽한 긴장을 추구하는 이론적 얼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에코의 작업이 긴밀한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는 입장은 그리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무엇보다 텍스트 기호학이 추구하는 텍스트 중심적인 세련된 이론 체계와 세계관은, 전기호학 시기에서 보여주었던 투박하지만 건강했던 현실 지향적인 모습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2. "열린 텍스트"와 기호학
전기호학 시기에서 에코가 화두로 삼았던 것은 "열린 텍스트" 라는 개념이었다. "열린 텍스트" 개념은 1962년에 출판된 [열린 작품Opera aperta]을 비롯한 전기호학적 글들에서 맹아적인 형태지만 풍부한 암시성을 지니고 제시된 개념으로, 바로 그 "열린" 특성으로 인해서 창조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텍스트를 가리킨다. 이 "열린" 해석의 가능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열린" 해석은 "열린 텍스트"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완성하고 그 실천적 잠재성을 점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실 에코는 "열린 텍스트"라는 개념을 기호학을 통해서 이론적 체계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 면에서 에코의 기호학 작업들은 초점과 강조점만 달리 했을 뿐 "열림"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이비드 로비의 견해는 받아들일 만하다 (OW, p. xv). 그러나 "열림"의 문제 의식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 개념을 기호학 이론에 담아내려는 에코의 작업이 과연 성공적인지는 의심스럽다.
문제는 에코가 거의 40년 전에 제안한 "열린 텍스트"의 개념과 입장을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린 텍스트"의 개념과 입장이 텍스트의 내부적 분석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외부 현실과 맺는 관계에 대해 매우 선구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를 담고 있는 반면, 그 견해가 에코의 기호학으로의 선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느냐 하는 점이다. 만일 유지된다면 에코의 기호학은 그야말로 "열린 체계"로서, 에코가 지난 40 년 동안 텍스트는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팽팽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만일 "열린 텍스트"의 개념이 에코의 기호학에 와서 훼손 내지 변형, 또는 실종되었다면, 그의 이론적 여정에는 심각한 단절 또는 왜곡이 자리잡고 있고, 더 나아가 그의 기호학이 이른바 "닫힌 체계"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에코 자신이 스스로의 기호학은 [열린 작품]의 이론과 자세를 발전시킨 결과이며 [열린 작품]의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른바 "전기호학적" 글과 "기호학적" 글 사이에서 발전과 배반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나의 결론은 이러하다. 에코가 설령 "열린 텍스트"의 개념을 결코 배반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다시 말해, 의도적인 배반이 없었다 해도, 적어도 그 이론적 구성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나의 이런 판단은 에코가 자신의 기호학 이론 체계에서 "열린 텍스트"의 개념을 운용하는데 있어 이론적 체계화는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열린 텍스트" 개념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사항들을 경시했다는 진단에서 나온다. 로비의 주장대로 하자면, 에코의 기호학이 "열린 텍스트"의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의 구성 요소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발전적으로 포함되었는지, 변형되었는지, 축소되었는지, 소멸했는지를 따져보지 않고서 막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 텍스트"의 개념이 기호학 체계 내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3. "열림"의 기호학적 발전 또는 퇴화
에코의 기호학은 1975년에 영어판으로, 그 이듬해에 이탈리아어판으로 나온 [일반 기호학 이론]에서 총정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책을 정점으로 그 이전은 기호학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그 이후는 기호학을 방어하는 보완적인 작업의 기간이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일반 기호학 이론]을 중심으로 한 그의 작업이 전반적으로 텍스트 해석의 유일한 방법으로 텍스트 전략을 꾸미는데 집중되어 왔다는 점이다. 텍스트의 역할, 기능, 존재성에 대한 그의 강조가 더할수록 그의 기호학적 체계의 유연성은 굳어져갔다고 보는 것은 재미있는 추정이다.
[기호학 이론]은 에코가 현실로부터 텍스트로, 윤리로부터 체계로, 해석적 의도로부터 텍스트적 의도로 옮겨간 분수령이었다. 다시 말해 에코의 기호학은 현실과 윤리, 해석적 의도보다는 텍스트와 체계, 그리고 텍스트적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호학의 중심부로 귀속되어 모든 텍스트-해석 과정을 이론화하는 거대한 기획의 근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호학 이론] 이후의 시기는 기호학의 응용, 즉 텍스트 기호학의 이론적 보완에 바쳐졌다. 시저는 이 점을 비교적 분명히 지적한다. 그는 에코가 전기호학 시기에서 제안했던 "열림"의 문제를 자신의 기호학의 토대 위에서 해결하고자 시도했다고 지적한다 (Caesar, p. 100). 그러나 시저는 그 시도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은 그리 자세하게 피력하지 않는다. 나의 판단으로, 에코는 일생에 걸쳐 "열림"의 개념을 해결, 더 정확히 말해, 이론화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 개념이 극히 잘못 해석되고 이론화되었던 것은 특히 [기호학 이론] 이후의 일이었다. [기호학 이론]의 근본적인 입장이 "열림"의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긴 해도, 의미작용과 의사소통이라는 기호학의 두 축에 의해서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역사적인 관심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에코는 "열림" 개념의 기호학적 이론화의 보완과 옹호, 그리고 텍스트성의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미 다른 글들에서 나는 "열림"의 개념이 에코의 기호학적 이론화에 의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를, "전기호학적" 요소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고 변형되고 또 실종되고 하는 정도를 측정하면서 보여주었다.
어쨌든 로비가 주장하듯이, [기호학 이론] 이전에 나온 글들, 특히 [열린 작품]에서 논의된 "열림" 또는 "열린 텍스트"의 개념은 문학이론의 최근 발전에 비추어 다시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로비의 의도가, 시저와 마찬가지로, 에코의 초기의 글과 최근 글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든 어쨌든 관계없이, 그가 열거하는 주제들이 [열린 작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의 글들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에코의 모든 저작들에서 본질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로비의 판단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사실 에코에 의한 "열림" 개념의 발전에는 어떤 단절 내지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단절은 에코의 기호학으로의 전향과 함께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혐의를 품어볼 수 있는 것이다. 그 혐의는 전기호학 시기는 기호학 시기를 위한 예비적 단계가 아니라 그와 독립된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에코는 "열림"을 기호학적 전망에서 이론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기호학적 글들에서 꾸준하게 "열림"을 다루어왔다고 주장한다. "열림" 개념의 기호학적 발전은 특히 [기호학 이론 (1975)] 이래 자신의 창작적, 이론적인 모든 글들에 스며들었던 "텍스트"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긴 "텍스트"라는 용어를 대놓고 쓰지는 않았어도, 그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적 문제(1956)]와 [열린 작품(1962)]과 같은 초기 저작들부터 이미 에코를 점유해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들 초기 저작들에서 에코는 "열림"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텍스트와 해석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 기호학 연구와 그에 관련된 에코의 글들은 언제나 텍스트와 그 해석의 문제를 "열림"의 전제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작업의 결과였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호학 시기에 쓰여진 에코의 대부분의 글들은 "열림"보다는 텍스트의 개념과 구조를 탐사하는데 훨씬 더 치중되었다. [시각적 의사소통의 기호론Appunti per una semiologia delle comunicazioni visive (1967)], [부재하는 구조La struttura assente (1968)], [내용의 형식Le forme del contenuto (1971)], 그리고 [기호Il segno (1973)]와 같은 책들과, <프랑스의 현재 왕은 총각인가 Is the Present King of France a Bachelor? (1974)>와 같은 논문들은, 에코 자신이 이탈리아어판 [기호학 이론Trattato di semiotica generale]의 서문에서 자신있게 말하듯이 (Tsg, 5-6), [기호학 이론]에서 이루어낸 기호학 체계의 서곡을 형성했다. 그 결과 [기호학 이론]은 텍스트 해석의 모든 과정에 안정된 체계를 부여하는 기호학 이론을 수립한다. 그 이후에 나온 [독자의 역할The Role of the Reader (1979)]과 [소설 속의 독자 Lector in fabula (1979)]는 해석 행위의 주체로서, 또는 ([소설 속의 독자]의 부제가 "서사 텍스트의 해석적 협력"이라고 붙인데서 알 수 있듯이) 서사 텍스트의 협력자로서, 독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독자의 역할]의 부제 "텍스트 기호학의 탐구"가 가리키듯이, 에코 자신의 기호학에 대한 보완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호학 이론]이 일반적인 기호학 이론을 건설하고자 했다면, 이들 저작들은 텍스트 기호학에 집중되고, 이는 이후 에코의 기호학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장미의 이름Il nome della rosa (1980)]과 [푸코의 추Il pendolo di Foucault (1988)]와 같은 소설들을 통해서 기호학을 실험하는 기간 이후에 나온 [해석의 한계The Limits of Interpretation (1990)]는 철저하게 텍스트성에 기대면서 해석의 논리와 한계를 규정한다. 나는 이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하는 에코의 기호학적 기획이 소위 "텍스트적 문턱"에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열림"의 대상인 현실과 역사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본다. 몇 년 후에는 [해석과 초해석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1992)]과 [산문 숲에서의 여섯 번의 산책Six Walks in the Fictional Woods (1994)]에서 에코는 텍스트성에 기초한 해석이 서사 텍스트 해석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기호학 시기에서 에코의 이론적 작업은 시종일관 독자의 역할을 기호학 체계 속에서 설명하는데 집중되었다. 이는 기호학의 관점에서 "열린 텍스트"의 개념에 총체적인 이론적 기초를 주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에코가 [기호학 이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기호학 체계 자체를 두드러지게 발전시키지 못했(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소설과 같은 다른 형식의 글쓰기를 추구하긴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기호학 이론을 수동적으로 막아내기에 급급한 인상 마저 준다. 이에 대해 시저는 에코가 텍스트 해석의 화용론적 양상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호학 이론을 계속 펼쳐왔다고 본다 (Caesar, p. 100). 시저는 "이러한 새로운 방향의 연구는 단일 발화로부터 텍스트에 의해 표현된 더 넓고 훨씬 더 복잡한 단위로 기호학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ibid)고 관찰한다. 그보다 덜하지 않게, 에코 역시 빈번히 강조하길, 이러한 새로운 방향의 연구는 전기호학 시기에서 그의 작업의 기초였던 해석과 컨텍스트의 문제에 다시 연결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에코의 기호학적 작업이 기호학의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왔을 뿐인지, 또는 "열림"의 개념을 이론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는지는 확연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 두 방향들이 전적으로 서로 모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기호학적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에코의 노력이 "열림"의 개념을 이론화하려는 그의 의도를 성취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에코의 기호학이 완성 직전에 멈추었거나, 이론의 현실 관여성을 포기한 채 체계의 완성에만 주력했고, 그 이후에는 그 미완성의 기계 장치를 땜질하는 작업만 수행해왔다고 본다. 그의 기호학의 바로 그 미숙성 자체는 "열림"의 이론화를 성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주로 그의 기호학이 경험적 작가와 독자와 같은 "열림"의 또 다른 요소들을 무시하면서, 텍스트적 과정에만 배타적으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의 기호학은 자기 정당화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은 "열림"의 주된 요소들 - 우리의 지식과 세계의 비결정성과 미완결성, 예술적 의도, 세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해석의 가능성, 그리고 형성하는 행위자forming agent에 의한 텍스트 또는 세계의 윤리적 해석 등 - 을 교착 상태로 몰고 간다.
4. 열린 "사회 기호학"인가 닫힌 "기호학의 제국"인가?
[열린 작품]을 쓰던 에코와 현재의 에코 사이에는 단지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열린 작품]은 이론적 체계를 결여한 독창적 생각이었고, 그 책 이후로 자신의 작업은 그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에코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 "미세한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도, 채울 수도 없는 거대한 틈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정확히 말해 이론에 대한 집중이 생산한 체계와 현실에 대한 참여 사이의 틈이다. 이 틈을 들여다보면, "전기호학적" 글들에서 풍요롭고 정치하게 논의되었던, 그러나 이후로 잊혀지고 왜곡되어온, 개념과 태도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틈을 벌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개념과 태도의 적절한 의미를 조명하는 것은, 에코가 [열린 작품] 이래 거의 40 년 동안 해왔던 논의와는 또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열림"의 또 다른 이론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문제는 에코의 기호학이 현실을 참조하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전기호학 시기에 그가 지녔던 현실에 대한 변증법적 긴장과 도덕적 태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열림"의 논의는 사실상 텍스트와 현실의 관계를 문제삼는다. 말하자면 텍스트의 해석이 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지느냐 또는 현실 세계로 나아가느냐, 또 텍스트 내에서건 현실과의 관계에서건 어떻게 그러한 해석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따위의 복잡한 문제들이 거기에 자리한다. 에코의 기호학(적 글)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herence을 문제로 삼는, 또 그것에 의한 해석의 논리를 구축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변화로운 양상을 텍스트의 고도로 구조화된 세계로 함축시키는, 일면 매력적이면서도 환원주의적인 오류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같다. 이에 반해 예컨대 기호의 자의성에 대한 레이몬드 윌리엄즈의 비판이나 피에르 마셔리의 "책의 침묵" 개념, 또 에드워드 사이드의 이른바 "세속성worldliness" 개념 등은, 언어와 텍스트의 자족적 체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현실과 맺는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었다. 또 쟈크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 - 에코의 그 개념과 완전히 다른 - 과 "컨텍스트" 개념은 텍스트와 현실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대단히 놀라운 이론으로 보인다. 만일 에코가 그의 기호학을 통해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면, 그의 기호학은 완전히 다른, 아마도 훨씬 더 풍요로운 모습이 되었을지 모른다.
또 다른 비판도 가능하다. 에코의 기호학은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가 되기 힘들다. 사실상 에코는 기호학을 "학문 자체로서보다는 많은 학문들을 보조하는 방법론적 접근"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한다 (Eco, 1978: 81). 이는 기호학이 "범기호학적pan-semiotic" 범주들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방법적 도구들의 통일된 세트를 가진다는(ibid, 81-2) 면에서 옳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기호학을 정의내릴 때, 에코의 기호학은 그저 자기 한정적인 체계로서, 또는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로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현상에 대한 그저 중립적인, 즉 "과학적"이고, 따라서 윤리와 정치를 초월하는 접근이라는 비판을 허용할 수 있다. 비록 그의 기호학이 해석과 설명, 그리고 체계화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행위와 함께 역사적 과정에 개입하고자 시도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더욱 깊은 구조를 찾는, 구조의 사슬에 얽혀있을 뿐이다. 에코의 기호학이 우리 지식의 불완전성이나 "열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식이 현실에 어떻게 관여하느냐보다는 그 지식 자체를 완전하게 다듬는 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에코가 기호학 이론을 역사적 과정에 개입시키고자 한다면, 그는 기호학 이론을 스스로 정의한 방법론적 도구로 사용해야만 한다. 즉, 체계를 짜맞추는 일을 그만두고 컨텍스트와 주체, 실천과 같은 "열림"의 요소들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런데 본다넬라는 에코가 이미 이런 작업을, 전기호학 시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일간지와 주간지 등에 꾸준히 기고하면서, 대중 매체에 대한 활발한 비평으로 실천해왔다고 말한다. 시저도 에코의 논의 범위가 당대의 문화의 일반 개념으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언어적, 윤리적 등등의 일상의 주제들까지 넓게 퍼져있다고 주장한다 (Caesar, p. 42). 시저는 이렇게 말한다.
매체를 생각하는 것은... [열린 작품]과 [예언론자와 순응론자]와 같은 '전기호학 시기'의 글들로부터 60년대 후반의 기호학의 체계적 탐구로 에코의 사고가 발전되어간 확고한 모습이다. 60년대와 70년대에서 매체를 논하는 그의 논지에는 '기호학적인 발전'이 있다 (Caesar, p. 42).
에코가 대중 매체의 실제 비평을 수행했고, 이것이 에코로 하여금 실제 세계와 역사로 나아가게 했다는 말인데, 옳은 말이다. "매체를 생각하는 것"이 에코의 전기호학 시기에서 나타났던 급진적인 문화 개념의 촉발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호학의 게릴라적 역할"에 포함되는 "혁명적 실천의 형식"에 에코가 끈질기게 관심을 기울이는 동기가 되었다(ibid, 45)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터이다.
그러나 내가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에코의 기호학이 "열림"의 요소들을 사회 역사적 관심을 포괄하는 학문을 정초하는 방향으로 이어받았는지 하는 물음이다. [열린 작품]과 [예언론자와 순응론자]에서 강하게 표출된 사회적 논쟁성은 [기호학 이론]에서 상당 부분 감쇠되었다 (물론 대중 매체 비평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에코가 지식인의 임무에 대한 초기의 입장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1968년 이래 그의 글쓰기가 저널리즘과 이론적 작업 양쪽으로 확연하게 갈라져 나갔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저널리즘에서 에코는 참여적인 태도를 견지했지만, 이론 작업은 훨씬 더 전문화되고 아카데믹하게 된 것이다. 물론 "글쟁이"로서 "글쓰기에 대한 순수한 사랑" (NR, p. 5)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론가로서, 기호학자로서, 에코는 자신의 창작을 지배하는 사고의 노선을 보여주어야 했다. 70년대 이래 에코의 글이 보여주는 전문화와 아카데믹화가 [열린 작품]을 이어받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치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저 역시 거의 입을 다물고 있다. 대신 그는 에코의 글들을 연속성의 관점에서 폭넓게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5. 이론과 경험
에코의 지적 여정에 연속성이 없다면, 그래서 전기호학의 정신과 개념이 기호학 시기에 와서 실종되었다면, 전기호학을 이어받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실천, 경험, 주체 등의 개념들은 에코의 기호학에서 소외된 부분들이다. 이들을 빼놓는다면, 에코 기호학이 "열림"을 이어받아 연속성을 이룬다는 주장도, 에코 기호학을 사회기호학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시저는 이런 점을 느끼고 있는 듯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그래서 그의 책은 에코의 지적 여정을 전반적으로 가볍게 조감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저자는 6장과 7장에서 에코의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단편적이고, 또 그 한계에 대한 대안 자체는 물론, 대안으로 가는 길목조차 제시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제안하는 논점은 주체와 실천, 경험 등의 문제들이다. 시저도 독자의 역할에 대해 길게 논의하면서, 에코가 글읽기와 독자의 주제를 기호학적으로 논의한 것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한다. 그것을 요약하면, 에코의 주장은 언어 공동체가 관장하는 해석적 구속과 해체에 속하는 일종의 무정부적 표류의 치열한 대립을 전제하지만, 거기서 "누가 또는 무엇이 '좋은' 읽기, 좋은 해석을 결정하는지"의 물음은 풀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험적 독자보다는 모델 독자를 우선시하면서, 사회적 조건을 그렇게 확연하게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에코의 논의는 읽기의 종류들 간의 이원적 분리, 또는 일반적으로 이원론에 의지한다 (Caesar, pp. 148-154). 이러한 입장에 서서 시저는 읽기와 독자에 대한 에코의 설명이 텍스트 중심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시저는 독자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이어야 하는가 하고 물으면서 "(모델) 작가 - 텍스트 - (모델) 독자의 연결 고리의 외부에는" 경험적 사용이라는 그늘에 가려진 지역이 있고, 그 결과 "텍스트는 언제나 독자를 그 자체로 끌어당기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ibid, pp. 155-160).
이러한 시저의 비판은 에코의 한계를 매우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독자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주로 집중되어있다. 반면에 독자 뿐만 아니라 작가와 텍스트의 전반적인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코가 작가와 독자를 텍스트 또는 텍스트 과정에 어떻게 합류시키는지 조사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에코의 논의에서는 텍스트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특히 90년대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것이 작가와 독자의 존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1990년의 태너 강연에서 에코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텍스트 해석이 모델 작가 (텍스트 전략으로만 나타나는) 의 이상적인 동업자인 모델 독자를 생산하도록 고안된 전략을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경험적 작가의 의도라는 개념을 급진적으로 불필요하게 만든다 (IO, 66).
이런 생각 위에서는 작가와 독자, 텍스트의 관계는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로 급격히 축소된다. 에코는 모든 텍스트는 독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게으른 기계라고 빈번하게 말해왔다 (SW, p. 3, 28, 49). 독자는 갈래 길들로 가득 찬 숲을 거닐 때 그러하듯이, 매 순간 선택을 하도록 강요된다. 그러나 에코는 요컨대 독자에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무제한한 해석의 가능성에 반대하고, 대신 독자의 역할을 텍스트의 장치 내에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반론에 대한 에코의 대비책도 있다. 에코의 기호학적 개념들 중 크게 각광받는 "백과사전" 개념은 작가와 독자의 경험성과 현실성이 기호학의 강한 이론 체계와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완충 지대의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졌다. "모든 기록된 정보 보관소", "도서관들의 도서관" (Sfl, 109)으로 정의되는 백과 사전의 개념은 퍼스에 의해 기초된 무제한적인 기호과정과 해석소를 에코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결과물이다. 그럼으로써 에코는 기호의 성격 자체를 역사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Caesar, p. 113 / Cosenza / Proni, p. 94 / Violi, p. 99) 백과 사전 개념을 가리켜 에코 기호학의 정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 개념이 퍼스 기호학을 종합적으로 추론한 것이고 또 통시적 구조주의의 필요에 부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소설의 독자 Lector in fabula]에서 텍스트를 작가와 독자의 실제 세계를 참조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에코가 이미 구조주의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실상, 에코는 "의미론적 백과 사전" 안에 터를 두는 가능 세계가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특이한 것도 아닌, 그저 "관념적"인 구성물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에코가 텍스트 전략을 위해 구축하는 가능 세계는 독자가 텍스트 내에서, 또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예상해야 하고 추측해야 하는 세계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과 추측으로 독자는 오로지 텍스트의 발전에 협력하는 역할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에코가 "열림"의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는 이렇게 그의 기호학이 기호과정과 실제 세계를 연결시키는데 기여를 하는지 검토하는 가운데 평가될 수 있다. 시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에코의 기호학을 "사회 기호학"으로 정의내린다. 예를 들어 스레드골드는 주체의 문제에 대한 에코의 기호학적 접근을 충실히 지지한다. 그는 에코를 인용하면서 ("경험적 주체는 단지 체계와 과정이라는 이중적인 기호과정의 발현으로서 정의되고 드러날 수 있다" (TS, 316)), "주체는 기호과정의 매개를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Threadgold, p. 118). 그러나 나는 이것이 단지 기호과정 체계 내부에 관계된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기호학적 범주는, 에코 자신이 확신하듯이, "경험적 주체의 행위의 동기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윤리적 평가와는 더더구나 관계가 없다" (TS, 316). 그러나 경험적 주체의 행위의 동기나 윤리성은 전기호학적 글에서 실천의 개념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천의 개념은 자신이 살던 당대의 세계와 현실에 참여하고자 했던 전기호학 시절의 에코의 도덕적 자세에서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대중 매체와 아방가르드 양자에 대한 에코의 관심은 전기호학 시기에 그의 실천 의식이 지녔던 방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는 "슈퍼맨"의 사회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는 "슈퍼맨"을 "정치적 의식과 완전히 분리된, 소시민적 의식의 완벽한 예"(Ai, 259 / RR, 123)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기호학 시기에서 에코의 윤리적 의식은 언어와 현실, 그리고 개인 중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 간의 마찰을 없애는 길을 찾으면서 구체화된다. 이는 기호학 시기에서 주체가 체계 내적 존재로 숨어들어 그 개념과 역할이 크게 위축된 것과 확연히 대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코의 기호학에서 모델 독자는 텍스트 전략의 주체, 즉 발화체의 주체일 뿐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발화의 주체, 즉 발화하는 주체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기호과정을 만드는 주체semiosis-making subject"나 "기호과정의 기호학적 주체the semiotic subject of semiosis" (TS, 315)는 기호학의 체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주체다. 에코는 기호학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단지 그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기호학" 대신에 "기호분석학semanalyse"을 제안하는 크리스테바를 비판한다 (TS, 317, note 2). 사실상 기호학이 기호과정(semiosis) 이전 혹은 밖과 연관성을 갖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에코의 기호학은 결코 크리스테바의 기호분석학을 따라갈 수 없다. 역으로, 에코 기호학은 자족적인 체계의 건설만을 목표로 할 뿐, 그것이 현실과 어떤 관여성을 갖는 지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에코가 말하는 주체는 매우 안정되어있다. 기호학 범주 내에서만 구성되기 때문이다. 에코는 "텍스트 외부적 '충동들 drives'이 '글쓰기ecriture' 활동으로서의 텍스트에 의해 드러나지 않을 때, 기호학적 틀 내에서 그들을 추론할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TS, 317, note 2). 이는 기호학에 의해 축조된 텍스트의 요새에서 안전하게 몸을 사리고자 하는 그의 바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에코의 지적 여정에서 나타나는 단절과 모순, 배반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적 길이 이론 체계보다는 현실에 대한 주체의 경험과 실천이 텍스트의 해석에 깊이 관여하는, 즉 "열린 텍스트"의 의미를 살려내고 여기에 기호학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론의 옷을 입힘으로써 모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에코에 대한 가장 최근에 나온 논저인 시저의 책에서 그런 내용이 그저 암시만 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시저의 책은 에코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나의 미래의 작업을 위한 퍽 유용한 안내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사실 에코가 우리에게 소개된 이래로 그에 대한 관심은 꽤 폭발적이었던 것 같다. 특히 그의 소설이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그의 이름을 신비롭게 만들면서 그의 기호학이나 철학 이론, 그리고 문화 비평의 위치도 함께 부쩍 격상되었다. 그러나 에코의 저작들에 대한 분석과 소개는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1981년에 테레사 데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가 100 쪽이 안되는 소책자 (Umberto Eco, Firenze: La nuova Italia)를 냈고, 에코에 대한 논문들을 묶은 책들로 1992년 죠반니 마넷티 (Giovanni Manetti)가 편집한 것 (Semiotica: storia, teoria, interpretazione - Saggi intorno a Umberto Eco, Milano: Bompiani) 과 97년에 터론토 대학의 로코 카포치 (Rocco Capozzi) 교수가 엮은 앤솔로지 (Reading Eco: an Antholog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그리고 97년에 나온 피터 본다넬라(Peter Bondanella)의 별 특징 없는 해설서 (Umberto Eco and the Open Text: Semiotics, Fiction, Popular Cul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가 전부다. 이런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시저의 작업은, 그 전면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조감과 종합으로, 이제 막 시작된 에코의 지적 세계의 평가 작업을 받쳐주는 토대의 역할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Umberto Eco: Philosophy, Semiotics and the Work of Fiction, Michael Caesar, Cambridge: Polity, 1999.
2) [열린 작품]의 시대적, 지적 배경에 대해서는, 졸고, [기호학적 해석과 문화 분석], 이어이문학 제 2집, pp. 195-238 (한국이어이문학회, 1996, 서울)을 참조할 것. 수정된 판으로는, [현대사상] 겨울호 (민음사, 1997, 서울, pp. 85-113)에 실린 <열린 작품, 세계, 해석>을 참조할 것.
3) 이에 대해서는 주 2)에서 소개한 글을 참조할 것.
4) 사실 "열린 텍스트"의 개념은 에코에 의한, 또 에코에 대한 글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열린 텍스트"의 개념 외에도 작가와 독자,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텍스트 전략의 문제, 그리고 해석과 상호텍스트성, 컨텍스트성등과 같은 주요한 문제들은 에코의 기호학과 텍스트 이론서에서 꾸준히 다루어져왔거니와, 이들은 모두 <열린 작품>에서 풍부하게 논의된 개념들이다. 에코가 자신의 작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목은 다음의 세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Lf, p. 8. LI, p. 6. IO, p. 23.
5) 이들은 모호성, 인식론적 은유, 형식과 정보 이론, 구조의 구조성, 형식과 열림의 변증법, 약호, 맥락, 상황성, 주체, 실천, 그리고 아방가르드적 정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들 중 형식과 정보이론, 구조, 약호등의 항목은 기호학의 수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변형되거나 생략된다. 더욱이 기호학에 공헌한 개념들도 "전기호학적" 시기에서는 나름대로 "열린 텍스트"의 개념을 받치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호학적" 글에서는 크게 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6) Eco, Umberto, Trattato di semiotica generale, Bompiani, 1975, Milano. 영어판으로는, A Theory of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Bloomington.
7) 졸고, "'열림'에서 기호학으로 - 움베르토 에코를 중심으로" (이어이문학, 5집, pp. 103-125). "근대, 그 탈주의 언저리에서" (비교문화 연구소, 부산외대, pp. 63-80). "열림, 컨텍스트, 해석의 한계" (기호학 연구, 제 6집, 한국 기호학회, pp. 57-90). "The Open Text and its Semiotic Theorisation in Umberto Eco: The Location of the Open Text" (국제지역학회, 제 3권 2호, pp. 189-204). "The Textual Limits of Umberto Eco's Semiotic Theory" (이어이문학 6집, pp. 91-118).
8) "예술에 있어 중의성, 복수성, 그리고 다의미성을 주장하고, 문학적 해석과 응답, 독자의 역할을 독자와 텍스트간의 상호 작용 과정으로 강조하는 것". (OW, viii)
9) 이와 관련해서 로코 카포치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 . 비평가들은 "열린 작품"과 해석, "무제한적 기호과정"에 대한 저자(에코)의 이론들을 텍스트와 독자의 "권리"에 대한 그의 초기의 입장과 관련하여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Rocco Capozzi,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The rights of texts, readers and implied authors", in Capozzi, Rocco, (ed.), Reading Eco: an Anth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1997, p. 217.
10) 로비는 이렇게 말한다. "[열린 작품]이 처음 나온 이후 에코의 사고는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그의 초기와 최근 글에는 본질적이고 놀라울 정도의 연속성이 있다". (OW, viii)
11) 에코는 이 논문이 <[기호학의 경계The Semiotic Threshold]에 삽입되었다고 밝힌다. 이 책은 [부재하는 구조La struttura assente]의 영어판으로 나온 것이지만, 기호학적 전체 전망을 새롭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이 [기호학 이론]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Eco, 1974: 1).
12) Lf, 8; li, 13-4; RN, 47; RR, 3; IO, 23; LI, 6.
13) 이러한 어려움은 기호학과 거기에 근거해 텍스트 해석의 문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에코의 노력이 대단히 폭넓게 이루어졌다는데서 나온다. 그것은 이론적 글에서부터 창작, 강연, 인터뷰, 정기적인 저널 기고문들 등등에 걸친다. 이런 모든 글들은 기호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전체 지적 여정은 기호학적 기획, 또는 소위 "기호학의 제국"에 의해 지배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TS, 6-7 / Tsg, 17 참조).
14) 에코 기호학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에서도 논의되었다. Sollace Mitchell, ("에코의 이론에는 사물로부터 떨어져나오는 잠재적인 표류가 엿보인다". p. 393.); Giulio Lepschy, pp. 711-14; McCanles, Michael, ("에코가 말하는 기호학은 의미를 만들고 소통시키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 '의미' 그 자체는 전적으로 그 과정 자체에 내재한다". p. 55).
15) 이에 대해서는 졸고, "열림의 정치학" (오늘의 문예비평, 제 32호, 1999년 봄호, pp. 258-280)과 "열림, 컨텍스트, 해석의 한계" (기호학 연구, 제 6집, 한국 기호학회, pp. 57-90)를 참고할 것.
16) 본다넬라의 이런 지적은 주로 한 시대에 쏠려있다. 그는 에코가 문화 비평을 가장 활발하게 펴낸 것은 1955년부터 60년대 중반까지였고, 이들은 대부분이 세 개의 책(de, Ai, sm)에 나누어 편집되었다고 지적한다 (Bondanella, pp. 41-66).
17) 이러한 주장을 받쳐주는 에코의 글들은 다음과 같다. Eco, 1965, "Una mutazione genetica"; "Il caso e l'intreccio. L'esperienza televisiva e l'estetica" (Oa, pp. 185-209. "Chance and Plot: Television and Aesthetics"으로 번역됨 (OW, pp. 105-122); "Appuntamenti sullar televisione", (Ai, pp. 317-357); "Semiotic Guerilla Warfare", 1967년 뉴욕에서 발표되어 Cc에 실리고(pp. 290-8) "Towards a Semiological Guerilla Warfare"로 번역됨 (THR, pp. 135-44). 이 점에 관해서 시저는 아주 풍부한 참고자료들을 정리해놓았다. 그의 책 pp. 37-47에 있는 각주 9에서 30까지를 참고할 것.
18) 다음 논문도 참조할 것. Bal, Mieke, "The Predicament of Semiotics", 1992, p. 549.
19) 특히 1 장 "Testo e enciclopedia" (pp. 13-26)를 볼 것. 이는 "Text and Encyclopedia" 로 번역되어있다 (Petofi, pp. 585-94).
20) Luke, Allan, p. 74. 에코는 이렇게 말한다. "텍스트는 가능 세계도 아니고 플롯도 아니다. 그것은 독자가 사는 세계 내에 있는 한 점의 가구이며, (소설의, 소설 안의 등장인물의, 소설 밖의 독자의) 가능 세계들을 생산하는 기계다 (RR, 246).
21) Caesar (1999), Gottdiener (1995), Bondanella (1997), Capozzi (1997b), and Threadgold (1986).
22) 대중 매체 비평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Robey, David, "Umberto Eco: Theory and practice in the Analysis of Media", 1990. 시저도 로비에 찬성하며 이렇게 말한다. "에코에게 있어 미디어의 연구는 기호학으로 가는 길이었지, 기호학으로 인해 미디어의 연구가 나온 것은 아니다. 에코에게 있어 미디어 연구에 대한 기호학의 영향은 제한되어있다 (Caesar, p. 46)." 즉 에코의 비평적 실천이 기호학의 성립에 영향을 끼쳤지만, 반면 기호학은 그의 실천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23) 주체에 대한 같은 견해는 Sfl (pp. 53-54)에서도 나타난다. 그 책에서 에코는 주체를 "기호과정을 생장시키는 깊은 충동"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시저도 지적했듯이, 정작 "기호학이 어떤 깊은 충동에 관여하게끔 만드는 강력한 그 무엇은 에코의 기호학 어디에도 없다" (Caesar, p. 107).
참고문헌
가. 단행본으로 출판된 에코의 저작들 (약어 첨부)
Ai Apocalittici e integrati, Milano: Bompiani, 1965; Apokalyptiker und Integrierte: Zur kritischen Kritik der Massenkultur, tr. Max Looser, Frankfurt am Main: S. Fischer, 1984.
sa La struttura assente, Milano: Bompiani, 1968.
de La definizione dell'arte, Milano: Garzanti, 1968.
fc Le forme del contenuto, Milano: Bompiani, 1971.
sab La structure absente, tr. by Uccio Esposito-Torrigiani, Mercure de France, 1972.
se Il segno, Milano: Mondadori, 1973.
cc Il costume di casa. Evidenze e misteri dell'ideologia italiana, Milano: Bompiani, 1973.
TS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5.
Tsg Trattato di semiotica generale, Milano: Bompiani, 1976.
sm Il Superuomo di massa, Milano: Bompiani, 1978.
Lf Lector in fabula: La cooperazione interpretativa nei testi narrativi, Milano: Bompiani, 1979.
RR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emiotics of Tex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NR The Name of the Rose, tr. by William Weaver, London: Secker & Warburg, 1992.
Sfl Semiotica e filosofia del linguaggio, Torino: Einaudi, 1984.
ATA The Aesthetics of Thomas Aquinas, tr. Hugh Bredi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Il problema estetico in Tommaso d'Aquino, Milano: Bompiani, 1982.
Oa Opera aperta: forma e indeterminazione nelle poetiche contemporanee, Milano: Bompiani, First ed., 1962; Second ed., 1967; Third ed., 1971 (In this thesis, the 1989 edition, which is the same version as the third edition, is used).
OW The Open Work, tr. by Anna Cancogni,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li I limiti dell'interpretazione, Milano: Bompiani, 1990.
IO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ed. by Stefan Collini,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rlp La ricerca della lingua perfetta, Bari: Laterza, 1993; The Search for the Perfect Language, tr. by James Fentress, London: Fontana Press, 1997.
RN Reflections on The Name of the Rose, tr., William Weaver, London: Minerva, 1994; Postscript on the Name of the Rose, New York: Harcourt Brace, 1984.
LI The Limits of Interpreta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SW Six Walks in the Fictional Wood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Sei passeggiate nei boschi narrativi: Harvard University Norton Lectures 1992-1993, Milano: Bompiani, 1994.
Kl Kant e l'ornitorinco, Milano: Bompiani, 1997.
나. 에코의 논문들
1974 "Is the Present King of France a Bachelor?", VS 7, 1974, pp. 1-53.
1978"Semiotics: A Discipline or an Interdisciplinary Method?", in Sight, Sound and Sense, ed. by Thomas A. Sebeok, Bloomington and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pp. 73-83.
다. 기타 참고문헌
박상진, "기호학적 해석과 문화 분석", (이어이문학 제 2집, pp. 195-238, 한국이어이문학회, 1996). 수정된 판으로는, "열린 작품, 세계, 해석", ([현대사상] 겨울호 민음사, 1997, pp. 85-113).
박상진, "열림의 정치학" (오늘의 문예비평, 제 32호, 1999년 봄호, pp. 258-280).
박상진, "'열림'에서 기호학으로 - 움베르토 에코를 중심으로" (이어이문학 제 5집, 1999, pp. 103-125).
박상진, "근대, 그 탈주의 언저리에서" (비교문화연구 제 6집, 비교문화 연구소, 1999, pp. 63-80).
박상진, "열림, 컨텍스트, 해석의 한계" (기호학 연구, 제 6집, 한국 기호학회, 1999, pp. 57-90).
박상진, "The Open Text and its Semiotic Theorisation in Umberto Eco: The Location of the Open Text" (국제지역학, 제 3권 2호, 국제지역학회, 1999, pp. 189-204).
박상진, "The Textual Limits of Umberto Eco's Semiotic Theory" (이어이문학 6권 1호, 2000, pp. 91-118).
Bal, Mieke, "The Predicament of Semiotics", Poetics Today 13, 3 1992, pp. 543-552.
Bondanella, Peter, Umberto Eco and the open text; Semiotics, fiction, popular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Caesar, Michael, Umberto Eco: Philosophy, Semiotics and the Work of Fiction, Cambridge: Polity, 1999.
Capozzi, Rocco,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The rights of texts, readers and implied authors", in Capozzi, Rocco, (ed.), Reading Eco: an Antholog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Cosenza, Giovanna, "I limiti dell'enciclopedia", Manetti, ed., pp. 115-128.
Gottdiener, M., Postmodern Semiotics, Cambridge: Blackwell, 1995.
Lepschy, Giulio, "Review of A Theory of Semiotics", Language, 53, 3, Sept. 1977, pp. 711-14.
Luke, Allan, "Open and Closed Texts: The Ideological/Semantic Analysis of Textbook Narratives", Journal of Pragmatics 13, 1989, pp. 53-80.
Manetti, Giovanni, ed., Semiotica: storia, teoria, interpretazione - Saggi intorno a Umberto Eco, Milano: Bompiani, 1992.
McCanles, Michael, "Conventions of the Natural and Naturalness of Conventions", Diacritics, 7, 3, fall 1977, pp. 54-63.
Mitchell, Sollace, "Semiotics, Codes and Meanings. Or: Meanings Are Not Always What They Seme", PTL, 2, 1977, pp. 385-96.
Petofi, J. S., ed., Text vs Sentence: Basic Questions of Text Linguistics, Hamburg: Buske, 1979, pp. 585-94.
Proni, Giampaolo, "L'influenza di Peirce sulla teoria dell'interpretazione di Umberto Eco", Manetti, ed., pp. 89-98.
Robey, David, Introduction of The Open Work, Umberto Eco; tran. by Anna Cancogni,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이 서문은 다음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Umberto Eco", in Writers & Society in contemporary Italy, ed. by Michael Caesar and Peter Hainsworth, Berg Publishers, 1984, pp. 62-87.
Robey, David, "Umberto Eco: Theory and Practice in the Analysis of Media", in Culture and conflict in Postwar Italy, New York: St. Martin's, 1990, pp. 160-77.
Threadgold, Terry, "The Semiotics of Volo?inov, Halliday, and Eco", American Journal of Semiotics 4, nos. 3-4, 1986, pp. 107-142.
Violi, Patrizia, "Le molte enciclopedie", Manetti, ed., pp. 99-113.
Copyright By 박상진
'문화이론 > 문화의 논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매트릭스(Matrix)로 철학하기(Matrix & Philosophy) (0) | 2008.09.06 |
|---|---|
| [스크랩] 장정일의 글 하나 (0) | 2008.09.06 |
| [스크랩] [움베르토 에코와의 대화] 문명간 교배시대 열쇠는 `톨레랑스` (0) | 2008.09.06 |
| [스크랩] 한반도 대운하, 문화재를 수장시킬 셈인가 (0) | 2008.03.04 |
| [스크랩] 황금알을 낳는 유머, 펀펀(Fun Fun)한 성공전략 (0) | 2008.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