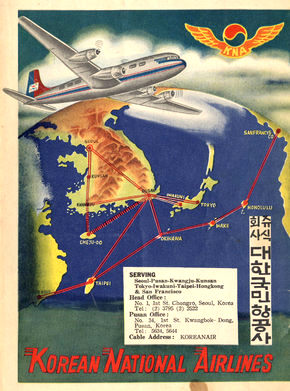| 날 수 없어 더 날고픈 인간욕망의 산물 ‘항공기’ 무수한 실패의 연료가 타서 내뿜는 불꽃 ‘편리-재난’ 양날의 칼도 어쩔 수 없는 운명 음속도 돌파했던 콩코드기는 은퇴했지만 탄생 100년 만에 레이더에서도 사라져 속도만 | |
 |
|
기술 속 사상/(18) 항공기술의 발달
얼마 전 런던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객기에 액체폭발물을 실어 공중에서 폭파시키려는 테러기도가 발각된 데서 보듯이, 항공기는 참으로 편리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끔찍한 재난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양날의 칼 같은 것이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항공기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공기의 제물이 되고 만다. 자신이 만든 글라이더로 2천회나 비행에 성공했던 독일의 항공기술 선구자 오토 릴리엔탈은 추락사고로 죽었으며, 최초로 동력비행에 성공한 오빌 라이트는 자신이 만든 비행기가 추락하여 크게 다쳤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살게 되어 있는 한 하늘을 날고자 한다는 것은 운명에 대한 거역이요, 이는 죽음이라는 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2차원의 평면을 떠나 더 크고 넓은 차원을 개척하고자 열망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운명이라면,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도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보잉747’ 괴물의 한국 상공 출현
항공기란 언제나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이자 삶의 방식이었으며, 또한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숱한 재난의 표상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를 테러의 표적이자 수단으로 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항공기란 매력적인 기계는 편리와 재난, 혹은 동경과 공포라는 이율배반을 항상 품고 있었다. 항공기의 이미지는 항상 거대한 괴물과 문명의 이기라는 두 가지 면에서 시소게임을 했는데, 꼭 시커멓고 무시무시한 폭격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형 여객기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야 보잉747은 전세계의 공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행기가 돼버렸지만, 1968년에 처녀비행을 하고, 1973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했을 때는 센세이셔널했다. 열명의 승객을 한 줄에 태울 수 있을 정도의 폭 넓은 와이드 바디에 2층으로 된 구조, 70t의 연료를 싣고 최대이륙중량 400t이나 나가는 이 괴물비행기는 전세계의 공항의 시설기준을 바꿔 놓을 정도로 파격적인 규모였으며, 이 비행기의 디자인, 역사, 운용에 대해 수 많은 책과 다큐멘타리 영화들이 나와 있다. 김포공항도 점보기의 취항으로 2468m의 활주로를 3200m로 확장하고 공항청사도 부분적으로 확장해야 했다. 점보기의 취항은 비행기가 커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간 항공여행의 보편화와 대중화를 의미했고, 보트피플에서부터 미국으로 언어연수를 떠나는 대학생, 노트북 컴퓨터를 든 비즈니스맨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체험하게 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히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인 것이다.
억세게 운 좋았던 라이트 형제
<항공기>라는 책을 쓴 데이빗 패스코가 항공기를 엔지니어링의 기적이라고 했을 때 ‘기적’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함의도 있지만, 항공기술발달의 역사는 곧 뼈아픈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2003년에 라이트형제의 최초의 동력비행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항공우주국의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비행기 ‘플라이어(Flyer)’를 원형 그대로 만들어서 풍동실험을 했을 때, 엄청난 첨단기술로 무장한 그들은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플라이어를 날게 할 수 없었다. 플라이어는 비행특성이 극도로 불안정하여, 곧바로 날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는 라이트형제가 비행실험 도중 목을 부러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극도로 운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라이트형제의 앞뒤로는 운 나쁜 발명가, 엔지니어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 항공 엔지니어링의 역사이다. 라이트형제 이전에 무동력 글라이더를 가지고 2천여회의 시험비행을 한 끝에 1896년 사고로 죽은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에서부터, 초음속 폭격기 발키리를 개발하다 수 많은 트러블 끝에 죽은 조종사들, 초음속 여객기 TU144를 미소합작으로 개발하려다 엄청난 돈만 쓰고 실패해버린 프로젝트, 그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엉뚱한 곳으로 전보발령된 엔지니어 등, 항공 엔지니어링의 역사에는 뼈아픈 실패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찬란한 항공기의 이미지는 실패라는 연료가 타서 내는 불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는 나는 기계일 뿐 아니라 보는 기계이고 꿈의 기계이며 폭력과 파괴의 기계이기도 하다. 항공기의 미래는 무엇인가? 항공기는 나날이 빨라지고 커지고 더 안전해지고 있지만, 또 한가지 특징은 우리의 시각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사라지고 있다. 항공여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사람들은 어떤 항공사의 표를 어떻게 사면 싸다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들이 이번에 태평양을 건너 뉴욕에 가는데 최초로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조종되며 최초로 종이에 설계도를 그리지 않고 전적으로 컴퓨터상으로만 설계된 항공기 보잉777을 탄다고 해서 특별히 흥분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항공여행이 흔해지는 정도에 비례하여 항공기의 모습은 우리의 시각장에서 사라진다.
군용기도 사라진다. 항공기라는 대상으로서는 훤히 드러나는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항공기와는 달리, 군용기는 훨씬 미묘한 가시성의 전략을 가지고 사라진다. 군용기는 적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눈이란 것이 인간의 육안 만이 아니라 첨단 레이더와 센서로 발달해 가자, 눈에 띄지 않기 위한 기술도 첨단화된다. 오늘날 생존을 위한 비가시성은 스텔스 기술이라는 형태로 결정화되어 있다.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군사적 가시성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그것은 육안에서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텔스 기술의 핵심은 레이더 스크린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더 빨리 더 크게 더 안전하게
항공기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속도다. 세계유일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그 속도는 숫자로 남아 있다. 총알보다 빠른 비행기 SR71도 마찬가지이다. 마하3.5의 속도에서 한번 유턴하려면 회전반경이 수백㎞에 이른다는 이 전설적인 비행기의 속도도 숫자상의 전설로만 남아 있다. 프랑스의 평론가 폴 비릴리오가 어릴 적의 전쟁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독일군이 라디오 방송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격해 오는 것에 공포를 느꼈다고 했던 전격전(Blitzkrieg)의 속도처럼, 항공기의 속도는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지각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다.
이영준/기계비평가 | ||||||||||||||||||||||||||||||
'철학의 세계 > 과학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20) 산업혁명과 마르크스 : “기계는 괴물이다” - 홍성욱 (0) | 2008.08.20 |
|---|---|
| [스크랩] (19) 인터넷 : 정보의 바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 손화철 (0) | 2008.08.20 |
| [스크랩] (17) 통신기술의 발달 : 한 글자 전송에 10만원 “기사 길게 보내면 잘려!” - 홍성욱 (0) | 2008.08.20 |
| [스크랩] (16) 시대의 경관으로서의 철도기술 : 디젤기관차와 KTX, 시속 그 이상의 차이 - 이영준 (0) | 2008.08.20 |
| [스크랩] (15) 시계의 역사 : 상대성 이론, 시계에서 태어났다 - 홍성욱 (0) | 2008.08.20 |